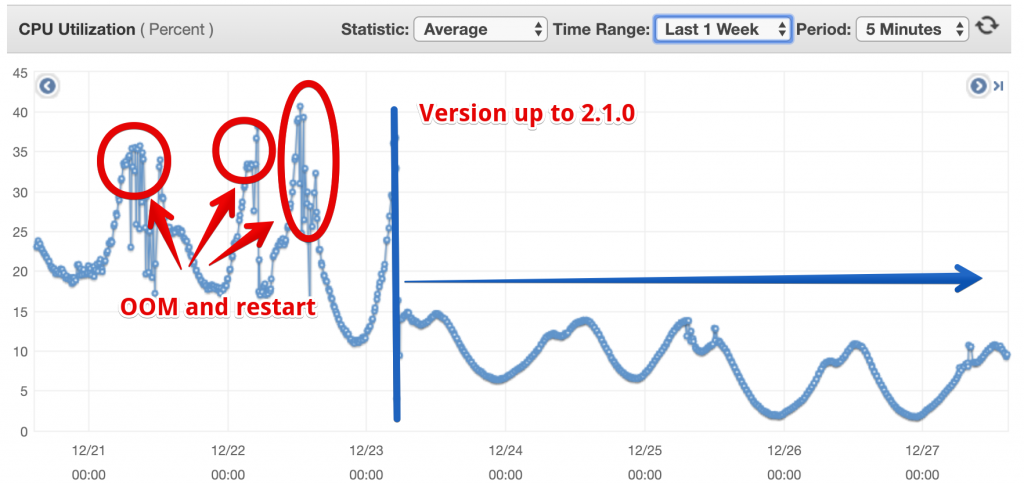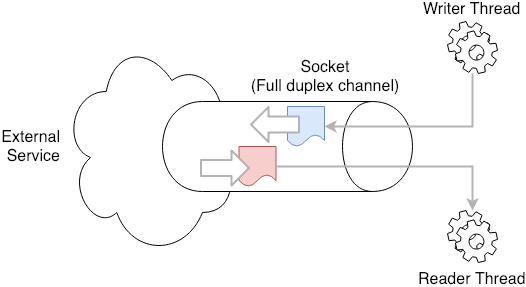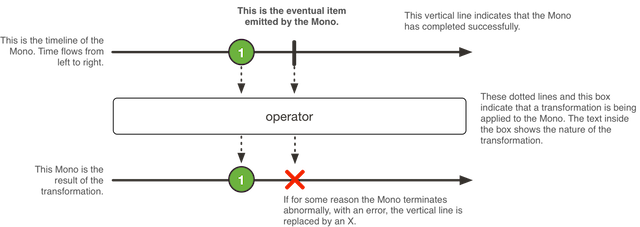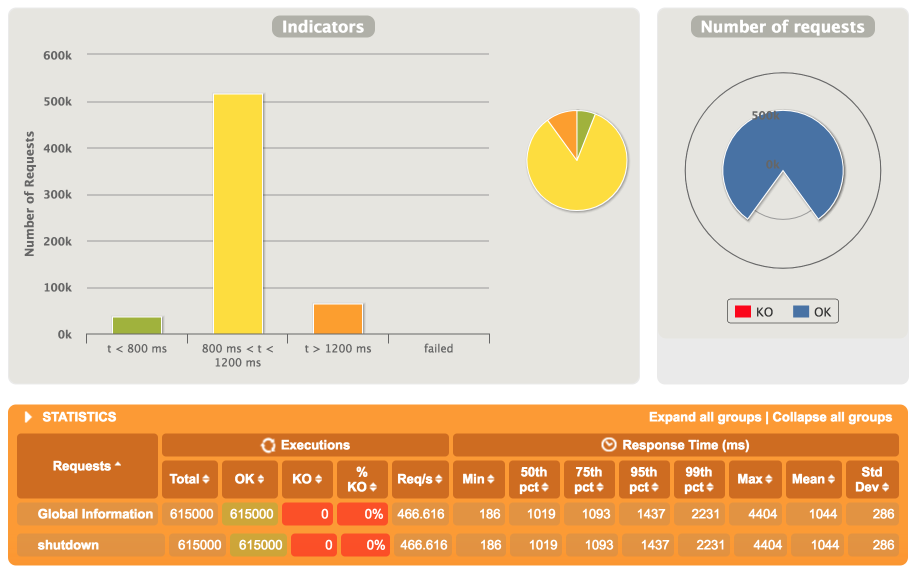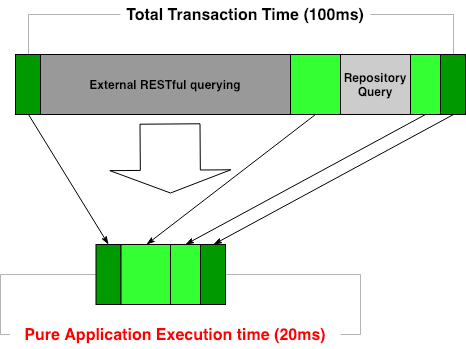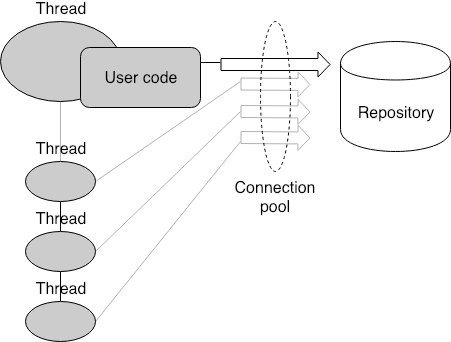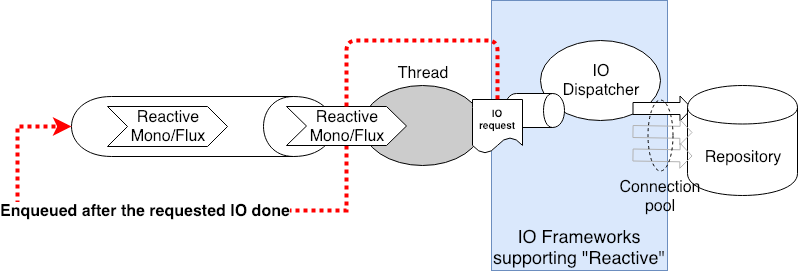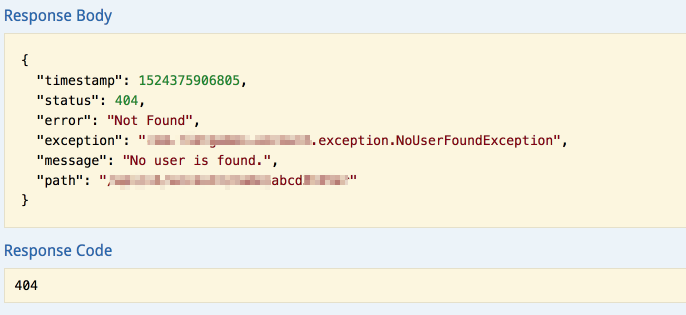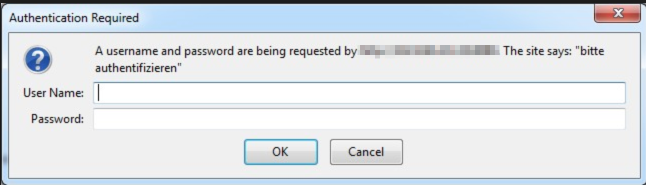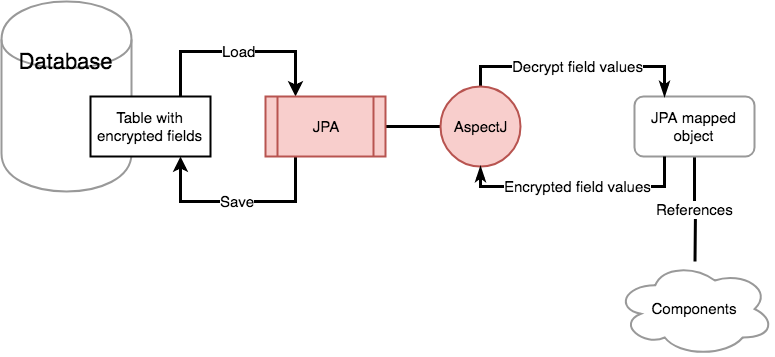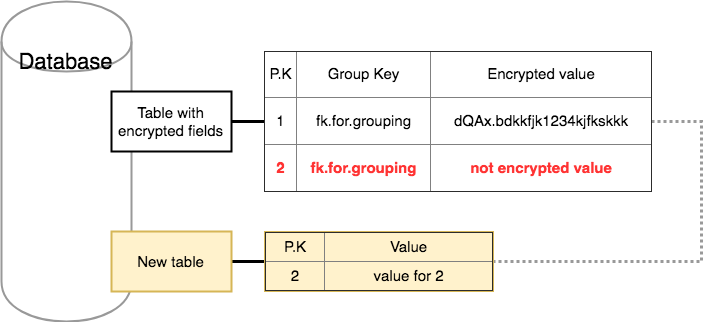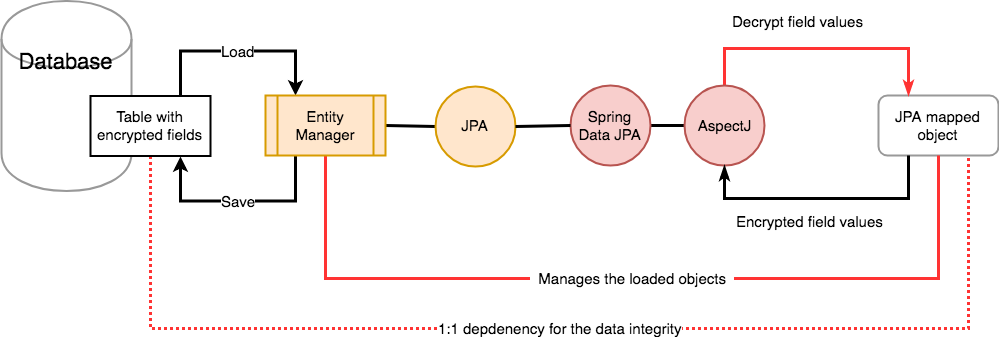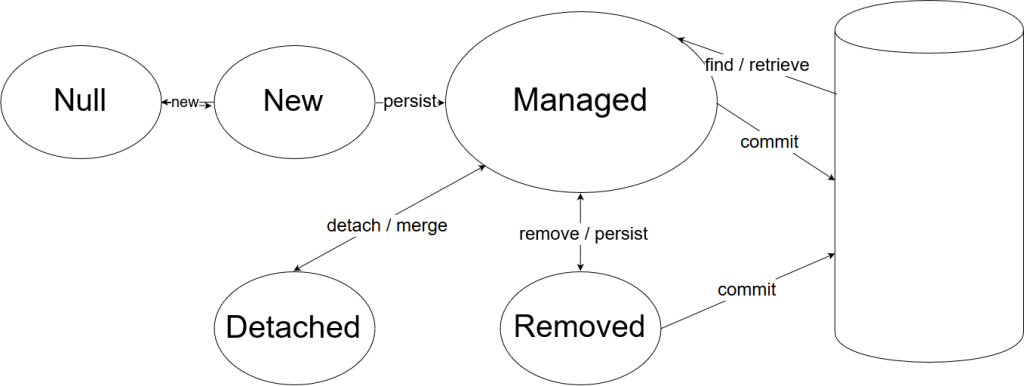라이엇게임즈에 입사해서 개발하는 것을 떠나 가장 큰 변화는 뭐였을지를 생각해본다. 아마도 영어가 아닐까 싶다.
사실 입사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 일을 하지만 한국에서 개발할 꺼리가 있으니 개발자를 채용하겠지… 라고 생각했다. 개발자가 코드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굳이 영어를, 그것도 내가 쓸 일이 얼마나 될까 싶었다. 입사 직후에 보니 영어를 할 줄 아는 PO(Product Owner)도 있는데 더욱 더 내가 영어를 쓸 일은 거의 없겠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어느덧 4년이란 시간이 흘러 개발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어로 나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다. 영어를 써본 경험이라곤 자유여행떄 가이드북에 나온 영어 몇 마디 해봤던게 전부였는데 말이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발전이다. 그렇다고 네이티브만큼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니 오해말자. 영어로 대화하는 건 아마 라이엇 한국 개발팀에 있는 모두 피하고 싶은 일들 가운데 하나니까.
왜 영어로 직접 말을?
라이엇 게임즈(RiotGames, Inc)는 다들 알다시피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다. 한국 오피스 입사 후 역시 기대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능을 개발할려면 본사 개발팀들과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물론 독립적으로 개발된 기능들도 있었지만, 기능이 정말 제한적이다. 제대로 동작되는 기능을 개발할려면 거의 대부분 필수 불가결적으로 센트럴 팀들과 이야기를 해야한다.
초반에 PO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네이티브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대부분 이메일과 화상회의(컨퍼런스 콜 or 컨콜)에 도움을 주었지만, 개발자로써는 충분치 않았다. 일반 업무 이야기는 PO 수준의 커뮤니케이션만으로 충분했지만, 기술 이야기는 달랐다. 특히 본사에서는 엔지니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팀은 엔지니어가 한국어로 한국 PO에게 이야기를 하고, 본사 팀에서 응답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었다. 내 성격이 좀 급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핑퐁식의 커뮤니케이션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필요하면 컨콜도 참여했다. 영어를 통한 Writing & Reading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듣고 말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특히나 내가 잘 못 들은건 아닐까 혹은 내가 입으로 내뱉은 말이 이해되지 않거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싶은 두려움 등등.
처음에는 이메일이나 슬랙/행아웃을 통해 텍스트를 중심으로 소통할려고 했다. 영어 텍스트는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좋다. 하지만 이 방식은 2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의사 전달에는 취약하다는 점이다. 본사가 있는 LA와 한국 오피스 사이에 17시간의 시차가 있다. 한국 오전 시간은 본사의 오후 시간이고 조만간 퇴근 시간이 된다. 아침에 이야기가 마무리 안되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다음날로 넘어간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전보와 다름없다. 또 상대방에서 응답을 주지 않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 텍스트다. 텍스트는 해석이 수반된다. 영어는 한국어와 다른 표현 체계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으라고 한다. 행간은 보낸 사람의 의도이고, 자칫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행간을 해석하거나 될 수 있다. 한국어로 쓰여진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빈번한데 영어로 쓰여진 경우에는 어떻겠나? 개발자/엔지니어로써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개발자도 인간이다. 잘못된 행간과 고집이 적절치 못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난감하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고역이다. 수습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 얼굴보고 이야기한다. 잉?? 한국 오피스에서 본사에 있는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하냐고? ㅎㅎㅎ 간단하다. 본사로 날라간다. 출장!
한국에서 개발해야할 사안이 중요하거나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가서 본사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을 한다. 하루에 1 ~ 3번 미팅을 한다. 다행스럽게도 라이엇의 모든 회의실에는 화이트보드가 있다. 말로 안되면 그림으로 소통한다. 현장에서 어떤 프로토콜, RESTful endpoint, 혹은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얻는게 합리적인지 바로 결정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그 친구 책상에 찾아가면 된다. 한국과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정책적인 의사 결정을 한국쪽에서 받으면 된다. 가장 빠르고 의사 소통의 혼선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는 덤으로 따라온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장갈 수는 없다. 3등석에 앉아 10시간, 12시간 비행을 하는 건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한다. 시차를 극복하는 건 더 힘들다. 음식도 맞지 않아 변비는 일상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종 컨콜을 이용한다. 출장을 통해 서로 얼굴을 익혀둔 친구들과는 컨콜로도 필요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단, 나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님을 그 친구들이 이해해 준다면.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할 수만 있으면 된다. 유창할 필요도 없다. 떠듬더라도 입밖으로 이야기를 꺼내면 듣고자 하는 상대방이 들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는 글로벌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읽고 쓰기 위해 따로 공부를 했던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개발과 관련해서 매일 읽고, 쓰는 것들이 영어이기 때문에 ㅎㅎ
다만 쓰는 표현 자체는 Business school을 나온 사람들의 유창한 표현이 될리 없다. 초반에 내가 영어로 쓴 글들을 가끔 마주치게 되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글이나 문장들이 많다. 사실 요즘에도 슬랙에서 이야기하다보면 단복수형이 틀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미국 친구들표현이 틀린 건 마찬가지로 허다하다. 그 친구들도 Business English를 쓰는 건 아니니까.
코딩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쓰는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짧게. 글이나 이야기가 길어지다보면 맥락을 놓친다. 것보다는 짧게 여러 문장으로 나눠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방식의 글쓰기는 꼭 영어로 이야기하는 경우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코딩을 짤때도 마찬가지다. 짧게. 자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영어로 글쓰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온라인 사전이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네어버 영어 사전에 가서 검색해보면 추천이 될만한 단어를 추천해준다. 거기에 추천된 단어를 활용해보자. 가장 피해야할 건 구글이나 네이버의 번역기를 돌리는 짓이다. 물론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영어를 써야하는게 일상이라면 되려 그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법이나 오탈자가 걱정된다면 Grammarly라는 툴을 사용해볼 걸 추천한다.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문장쓰는데 Grammarly만한 도구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듣고 말하기와 관련해서는 1:1 토론 수업을 추천한다.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듣거나 말하기 역시 자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개인적으로 1:1 토론 수업을 해본적은 없지만 만약 단기간에 실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이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한다. 일주일에 1~2번 원어민이 원어민 발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는 발음을 교정해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앂다.
영화로 연습하기
회사 일을 하며 사용한 방법은 1:1 토론 수업 방법은 아니다. 나는 특정 영화 1개를 정해놓고, 그 영화의 대사를 반복적으로 듣고, 주요 대사를 가장 흡사하게 따라서 발음하는 방법이다.
라이엇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방식에 활용한 영화는 아이언맨 1편이다. 아이언맨의 팬이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아이언맨은 열심히 봐둔 편이었고, 1편의 토니 스타크와 아이언맨의 광팬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주로 아이언맨을 지하철 출퇴근하면서 봤다. 출퇴근길 집과 지하철역을 오가면서 주요 대사를 따라해보기도 하며, 주인공 토니의 발음을 비슷하게 흉내낼려고 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동굴에서 탈출 후 MARK-II 만들기 시작할 때 예전 MARK-I의 도면을 홀로그램으로 올리는 장면이었다. 영화가 나올 당시에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영감을 원했는데, 이 부분이 깊은 인상을 주긴 했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걸 몇 번이나 개발팀에 틀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영상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 대사가 나온다. 개발을 마치고, 비행 시험을 하면서 자비스에게 하는 말.
Jarvis, sometimes you gotta run before you can walk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기보다는 어느 때에는 틀을 깨고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다. 주변에서 보면 틀이라는 프레임에 안주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그 다음 영화로는 마션이었다. 아마 마션도 100번 넘게 Playback 하면서 나오는 문장을 듣고 맘에 드는 문장을 따라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우선 내가 좋아하는 SF 장르의 영화라는 점이다. 토니 스타크와 마크 와트니가 보여준 역경을 기술을 사용해서 극복하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좋았다.
특히 이 두 영화가 듣기와 말하기기 연습에 좋았던 이유는 주인공의 독백 형식의 대사가 많다는 점이다. 독백 형식이기 때문에 말 속도도 빠르지 않고, 사용되는 단어도 어렵지 않았다. 온전히 한 캐릭터의 감정과 말투에 몰입해서 따라하기가 다른 영화들보다 쉬웠다고나 할까? 다른 영화 몇 편을 가지고도 비슷한 시도를 해봤지만, 주고 받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따라하는 용도로는 그닥이었다.
그럼에도 실전이다.
1:1 토론 수업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아무리 영화에 나오는 케릭터를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정해진 내용/대사/단어를 반복할 뿐이다. 어찌보면 죽은 영어다. 1:1 토론 수업이 좋은 이유는 살아있는 지금의 영어로 말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듣는 역량을 키우는 건 여러 방식을 가능하지만 말하기는 다른다.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좀 무식했다. 일단 출장가서 일을 해야했기 때문에 되던 안되던 필요한 내용을 내 입을 통해 말해야 했다. 와중에 지금까지 출장 가운데 1/4 정도는 혼자 출장을 갔으니까. 제대로 전달이 될 턱이 없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것도 안되면 화이트 보드나 연습장에 적어서 이해를 시켰다. 그럼 그 친구들이 그들의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해준다.
Yes, That’s it.
이러면서 하나씩 그 친구들의 말을 배웠다. 제대로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려면 코드가 맞아야 한다. 사실 전까지는 “Fuck” 이나 “Shit” 같은 단어는 욕이고 절대로 쓰면 안되는 단어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일상에 흔히 이야기하는 감정 표현 단어다. 물론 함부로 쓰면 안되지만, 적절한 교감이 있다면 이 단어들은 “이건 말도 안되는데…” 정도를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문장”일 뿐이다.
영역(Domain)이 틀려지면 사용하는 영어도 틀려진다. 그러면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식당에서 주문할 때다. 음식이나 재료의 이름을 내가제대로 알턱이 있나? 더구나 굳이 이걸 힘들여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다. 그래서 가급적 식당은 메뉴가 그림으로 설명된 곳이 가장 반갑다. 관광지에서 해외 여행 몇 번 해보지 않은 와이프가 나보다 더 잘 주문하는 경우를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의지의 문제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써야하고, 많이 접해보는 것 이외에 왕도는 없다. 요즘에도 본사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컨콜이 잡히면 앞서 이야기한 영화들을 보면서 귀를 풀어주고, 입을 풀어준다. 그리고 해야할 말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기보다는 내가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 입으로 이야기한다. 쪽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해야하는 파트너가 제대로 된 컨텍스트를 얻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내 입을 통해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처음 라이엇에 입사했던 그때보다는 해외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좀 늘어난 건 맞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할려고 한다. 가끔 많이 피곤하면 영어로 잠꼬대를 한다고 가족들한테 욕을 먹긴 하지만,… 뭐 이런 부작용은 눈감아주지 않을까??? ㅎㅎㅎ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