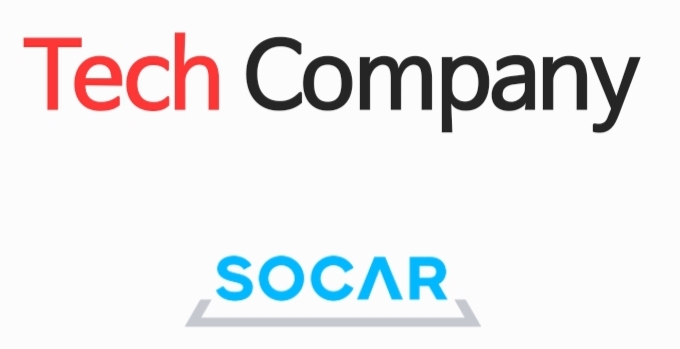
기술 기업의 핵심은 뭘까? 쏘카에 합류하면서 받은 요청 사항을 관통하는 단어가 “기술 기업”이었다. 사실 그전에는 기술 기업(Tech Company)이라는 단어는 기업을 포장하기 위한 미사 여구라고 생각했다.
쏘카를 기술 기업으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아했다. 자동차를 기반한 서비스이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십년 가까이 제공하고 있으니 이미 기술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술 기업” 아닌가? 시장에서 기술 기업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회사들 역시 많은 트래픽과 소위 최신의 혹해보이는(Fancy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한국의 많은 기술 기업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는 큰 변화가 없다.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하다.
기술 기업이란 뭘까?
나는 두 단어 자체에 이미 정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기업. 어렵게 생각할건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 전통적인 기업들(소위 굴뚝산업)을 기술 기업을 여기지 않는다. 실리콘벨리 Big Tech 기업들의 영향인지 인터넷, 유형보다는 무형의 자산(주로 Contents),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세상에 없던 개념 등등을 기술 기업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기술보다는 투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기술 기반의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기술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나도 실리콘벨리를 빌려 한발짝 더 나아가면 기술을 통해 실현한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여할지, 스스로 메시지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기술 기업이다.
서비스를 만드는 책임자로써 나는 기술에 주목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업, 그리고 이걸 실체화시킬 기술이 필요하다. 때로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해내야 할 때도 있고, 존재하는 여러 기술들의 최적의 조합을 필요하기도 하다. 최종적으로 기술들이 서비스와 제품의 형태로 완성되어 고객들에게 전달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질문해보자. 그럼 이 기술을 발명과 조합은 어떻게 이뤄지나?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아이러니하게 기술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역시 사람이다. 고 이건희 회장이 “천재 한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어록을 남겼다. 당연히 인재는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다.
10만명을 먹여 살리려면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대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장인(Craftman)이 홀로 대장간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는 안된다. 아이언맨처럼 자비스의 도움을 받아 혼자 멋진 슈트를 만드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영화속에만 존재한다.
사람이 핵심이다.
물건은 사람이 만들고 혼자서는 만들지 못한다. 결국에는 사람들, 즉 팀이다. 그리고 그 팀들이 조화된 곳이 회사라는 조직이 된다.
인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인재들이 조화되는 팀이 있어야 한다. 그 팀이 회사가 변화시킬 세상에 대한 미션을 수행한다.
이 구조에서 나는 팀의 조화가 미션 수행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 팀의 성과(Performance)는 결국 팀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얼마나 기대되는 혹은 기여하는 일을 수행하는냐에 따라 달렸고, 이걸 “조화로움“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적인 난제를 푸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복잡도는 떨어지지만 귀찮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팀에게 주어진 일이다. 팀 안에서 이 일들을 모두 해결해야 하고, 가능한 최대한 성과와 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일을 나누고 도와야 한다.
혹자는 개인별 역량에 따라 할 일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별하게 되면 일에 대한 쏠림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할 것이다. 누구나 보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원하지 역량과 무관한 일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일은 청소부의 몫이지 나와 관련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깨진 창문 이론을 팀이 맞닥들인다.
조화로운 팀이 되기 위해서는 팀 리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근본 특성인 이기주의를 넘어선 이타성을 팀원들이 보여주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대화는 필수다. 팀을 위해 개인의 헌신(희생이 더 적절할지도)을 부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팀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성과이고, 팀원은 이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팀 리드는 필드 코치로써 직접 보여줄 부분은 보여주고, 팀의 성과를 위해 지시할 사항은 지시해야 한다.
아버지 뭐하시노?
팀원의 헌신이 헌신으로 잘 동작할려면 불합리하지 않아야 한다. 팀 리드가 권한을 앞세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한국 조직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저항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리드는 구성원을 알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구성원 역시 리드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기계와 일하는게 아니라 사람과 일을 한다. 업무 역량이 “사람”으로써 팀원/팀장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가졌다한들 아이가 아프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당장 일이 손에 잡힐까? 그리고 이런 사람 붙들고 왜 일이 그전만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의미없다. 되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원망스러울 뿐.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문구를 따오긴 했지만, 팀 구성원이라면 다른 구성원의 개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영화처럼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수준이면 족하다. 이 과정을 통해 느슨한 연대가 만들어진다. 사람으로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다.
쉽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쉽지 않다. 이 수준의 신뢰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가드(Guard)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의 사적 영역 일부를 먼저 공개해야 상대방의 가드도 내려간다. 내가 열린 자세가 되지 못했는데, 상대방에게 그러라고 하는건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이런 모습을 먼저 리드가 보여줘야 한다.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그 태도가 진심이라고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가드를 내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 Radical Candor와 Dare to Lead 책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팀을 떠나 조직 안에서의 협업은 항상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대화와 토론이 이어진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를 질문해보길 추천한다. 사람으로의 이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토론이 지속되면 결국 날카로운 칼에 당사자들부터 다치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발짝 물러나 사람을 아는 과정부터 해보길 추천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적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신뢰란 쌍방의 관계이지만 그 수준은 각자가 정한다. 가드를 내리더라도 그건 내리는 사람 맘이다. 그 마음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이미 쌓았던 신뢰 관계도 사라지고 만다. 남의 집 숟가락, 젓가락 숫자를 알려고 하지 마라.
다음에는 기술 기업, 쏘카의 사람과 조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